|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 뭄멜제
- 힐데가드 폰 빙엔
- 마늘풀
- 코바늘뜨기
- 독일흑림
- 뽕나무
- 익모초
- 싸락눈
- 꿀풀
- 바질소금
- 흑림의 봄
- 흑림
- 바질리쿰
- 루에슈타인
- 흑림의 코스모스
- 흑림의 오래된 자동차
- 헤세
- 흑림의 여뀌
- Schwarzwald
- 독일 흑림
- 감농사
- 흑림의 성탄
- 흑림의 샘
- 우중흑림
- 잔설
- 카셀
- 독일 주말농장
- 텃밭
- 흑림의 겨울
- 프로이덴슈타트
- Today
- Total
독일 ,흑림(Blackforest)에 살으리랏다
말 본문

말
/김성신
두부 같은 집이었지, 바위처럼 단단한 집이었지
당신의 젖은 귀와 부르튼 입술을 생각해요
오체투지, 바닥에 낮게 엎디는 참례의 시간
맹금처럼 날 선 발톱이 풍경을 수습하고
비로소 내려앉은 마음들은 먼 곳을 바라보네
어제와 오늘 사이의 음소가 분절될 때
울적의 리듬은 박장대소와 굿거리장단에도 후렴을 맞추지
어디에도 가닿지 못한 묵음이 벽을 뚫고 울려 퍼지지
허공을 가로질러 바라보면 이 세상은 때로 질문들의 증명
먼 곳에 있는 것이 가장 가까운 곳으로 숨 쉴 때
가로지르는 것이, 내 옆에 있었음으로
누군가 되물어도 입술을 깨물 뿐
말의 섬모는 부드럽지만 함부로 내뱉을수록 공허해져
끝은 뼈처럼 하얗구나
함부로 내뱉은 말들이 부유하는 소란의 세계
돌아나가던 命이 여기서 저기로 숨어들면
혀를 내밀어 숨겨진 말맛을 핥는다
음, 그늘진 속이 보일 땐 아늑하기까지 하군
오랫동안 놓지 못한 헛꿈이 측면으로 사라진다
굽이치는 강물에 작은 손바닥을 휘저으며
고립에 빠진 낯이 쉬웠다는 일기장
쓴다, 지난한 것들이 번져가는 달그림자를
무수한 별들
당신이 홀린 말에 박혀
차마, 혀를 빼내지 못한
그 사이의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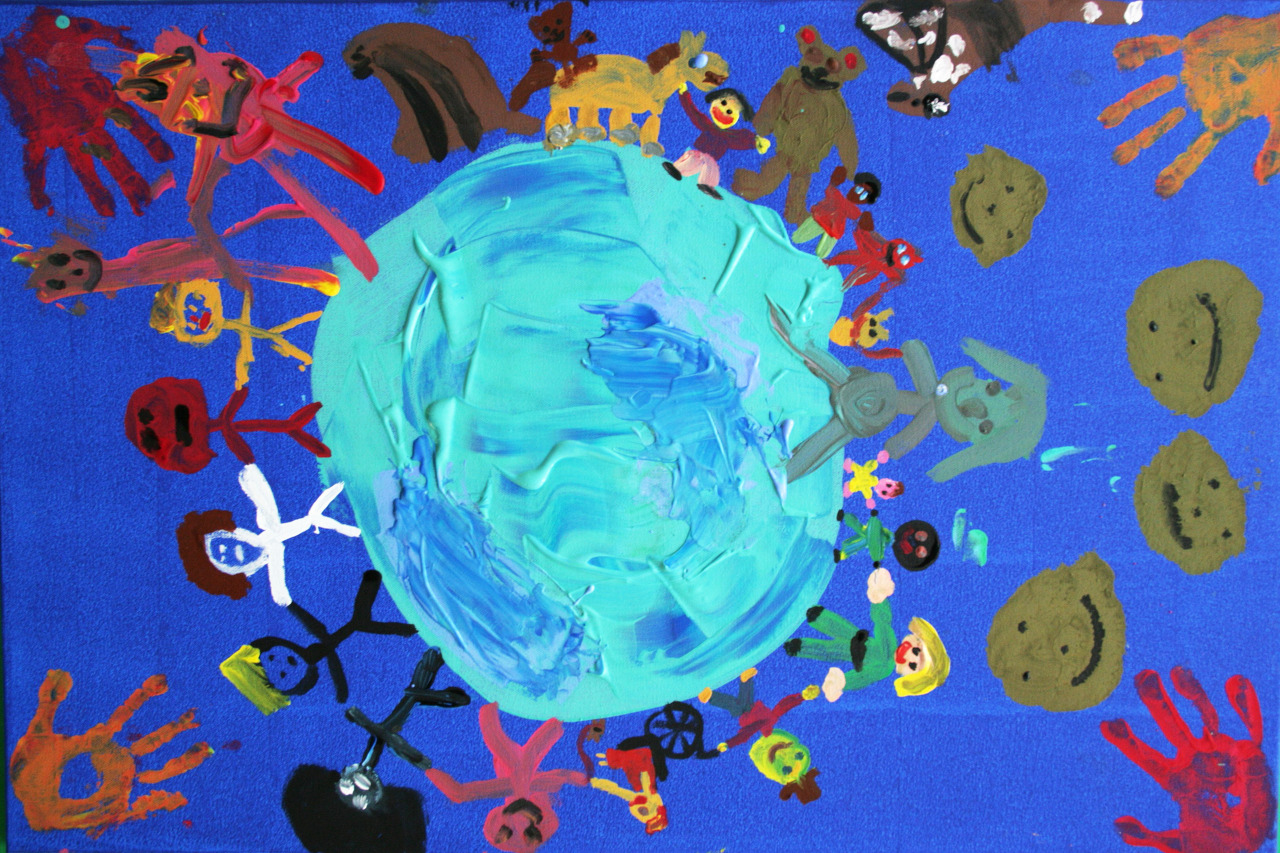
.....
말로써 차려진 세상은 마치 뷔페식당처럼 되었다.
여러 선택 중에 한가지만 골라서 취할 수 있는....
시를 읽고 말의 섬모에 대해 가늠해 본다.
부드럽거나,
부드러움으로 가린 날카로운 칼날이 그 본질인 것에 대해.
청상으로 평생을 산 내 백모님은
동넷사람들의 '말'을 목숨보다 무서워하셨었다.
철이 들어도 한참 든 나는
굽이 치는 강물처럼 말들이 모여 흐르는 세상으로부터
숲 깊숙이 들어와 있다.
강으로 흐르는 조그만 개울 소리를 수시로 듣지만
그 또한 잊은 듯 지낸다
가마 가지런한 백모님의 쪽진 머리에 날마다 빛났던 은비녀의 기억처럼.
.....
이렇게 읽힐 시가 아님을 안다.
그러나 말로써 말을 더 보태는 것을 대신하였다.
'수평과 수직 > 사람과 사람사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름다운 카르멘 (14) | 2023.05.16 |
|---|---|
| 겨울 편지를 쓰는 밤 (0) | 2023.01.14 |
| 시로 토해낸 남자를 소재로 쓴 시 (17) | 2022.09.22 |
| 꽃 시를 쓴 이에 대한 기억 (0) | 2022.09.15 |
| 고흐의 귀지우개, 상술이라는 가소로운 가면 (1) | 2022.02.24 |




